|
수산부산물이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돌아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8월5일 제4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만기 의원(고창2)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는 대량으로 발생하면서도 대부분 매립·소각돼 온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이번 조례는 5년마다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발생·처리·재활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수집·운반 및 처리 ▲연구·기술개발 ▲재활용 제품 개발 ▲판로 확대 ▲자원화시설 설치·운영 등의 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자원화시설은 도가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시·군에 위임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도 구축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농축산 부산물보다 많은 수산부산물이 대부분 폐기물로 처리돼 어업인들이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조례를 통해 체계적 관리 틀을 갖추면 환경 보전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는 “수산부산물 자원화는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과 순환경제 전환에 필수”라고 강조하며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조례 시행으로 전북 특화 수산부산물인 패각·어분·해조류 부산물 등이 비료·사료·바이오 연료 등으로 재탄생할 길이 열린다. 도는 내년까지 실태조사를 마치고 2026년 첫 기본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예산 확보와 자원화시설 입지 논의가 과제로 남지만, 어촌계·가공업계가 조례 시행에 기대를 표시하며 협력 의사를 밝힌 만큼 추진 동력은 충분하다는 평가다.
이번 조례는 수산업이 강세인 전북 서남해권 지역에서 자원순환 정책을 제도화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자원화시설 구축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해안 투기·불법 소각으로 인한 환경 오염이 줄고, 부산물이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전환돼 어업인의 부가 수입원이 될 수 있다. 동시에 도는 자원순환·탄소중립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된다. 향후 예산 배분, 기술 지원, 판로 개척을 놓고 행정과 업계가 얼마나 긴밀히 호흡하느냐가 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할 전망이다. 과감한 정책 집행과 투명한 관리 체계를 통해 ‘친환경 바다’와 ‘돈 되는 부산물’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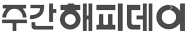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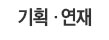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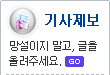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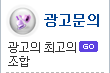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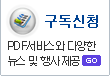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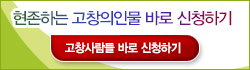
 고창군, 추석 전 전군민 20만원 지원 확정
고창군, 추석 전 전군민 20만원 지원 확정